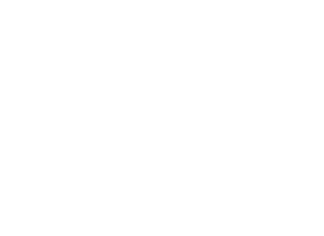
공학도이고 문학도였던 예전의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법정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법이 알아서 정의를 찾아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다. 물론 ‘아름다운 판결문’이라고 회자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비현실적이고 드문 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현실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냉혹한 법언의 압도적 지배하에 있다.
수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 모두가 격하게 끓어올랐었다. 뒤이어 나온 같은 저자의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냉담을 떠올려보면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갈증이 우리 모두에게 휘몰아쳤다고 해야 옳겠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우리에게는 법이란, 법치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곧 정의라는 명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법이 되는 것으로서의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에는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법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힘이며, 그래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스스로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 힘이다. 힘이라는 표현이 우리사회에서 다소 거북스러운 것인 줄 잘 알지만, 법의 힘이든 법적인 힘이든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을 띠지 않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힘의 작동형태인 것. 정의 없는 힘은 전제적인 것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힘과 힘이 충돌하는 양태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위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에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 법이란 정의 없는 힘이 아니며, 결코 그러해서는 아니 된다. 무기력한 정의 또한 우리의 법은 아니고, 아니어야 한다. 그러기에 지금 서로 다른 힘과 힘은(그 충돌의 힘마저도) 법의 힘에 융해될 수 있으며, 응당 그리 될 것이라고 바라고 또 믿는다.
어느 문학평론가는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짐승스럽다고 하더라도, 더러움이, 추함이, 짐승스러움이 세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짐승스럽다면, 우선,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짐승스럽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냉혹한 현실 앞에도 우선, 법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
변호사
